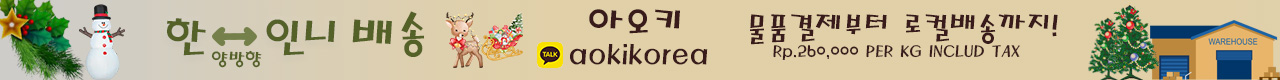비껴가는 이들의 뒷모습은, 오는 이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넘겨주는 듯 속삭이고 있다.
자카르타 공항의 사람들은 모두 한 보따리씩 밀고 들고 다닌다.
그런 곳에서 차 한 잔을 놓고 나는 기다림을 마신다.
커피 향은 창문으로 피어오르고, 창문은 택시를 낳고 그 택시들은 나를 기억의 저편으로 안내한다.
나는 '수라바야 이웃 도시 말랑'에 살고 있어 자카르타에는 그리 자주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2년 전 현지인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생긴 일이다.
비싼 모범택시를 탈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곳에 삼 년은 살았는데 용기 만발하던 나는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Blue bird 택시를 탔다.
『 좋은 밤입니다. 아저씨 망가두아 아파트로 가 주세요. 미터기를 사용합시다.』
『 네. 좋습니다.』
택시는 공항을 서서히 물리면서 출발 했다.
공항을 반쯤 빠져 나올 무렵, 택시 기사는 무슨 생각을 키웠는지 앞 뒷좌석의 문을 잠그더니 이십만 루피아를 내야만 그곳까지 간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친구 집에서 공항으로 올 때 고속도로비 내가 지불하고, 9만 루피아로 타고 왔는데 그것도 모범택시로 이건 모범택시도 아니면서.....
뭔가 이상하다, 는 느낌들이 가슴을 치받았다. 항상 덜렁대고, 기고만장하던 나는 불빛에 보이는 ‘하늘색’만 보고 탔던 것이다.

그건 개인 택시였다. 그리고 '여기는 나의 나라다.' 라는 무언으로 비친 운전기사의 눈에 나는
이방인, 이라는 간판을 무겁게 걸머지고 있었다.
그 때 자카르타는 어쭙잖은 7시!
깡마른 뒤통수의 깐깐한 인상의 택시 기사. 그 기사가 출세를 향해 바쁜 팔다리와 시장기가 도는 나의 인간성을 실험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문제는 바가지요금이 아니라, 가녀린 나의 신변에 털컥 겁이 났다.
'그래,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나?' 일단 가는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저씨, 아주 급한 일이 생겼으니 차를 잠시만 세워주세요.』
못 들었는지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 번 말했지만 그는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한 일은 차가 아직 한적한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핸들은 기사가 잡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항상 뒤늦게 번쩍이는 나의 지혜. 나는 내가 앉은 옆 그러니까 뒷좌석의 문을 조금 열었다.
운전 중에 문이 열리자 기사는 위험하니 문을 닫아 달라고 했다.
‘옳지, 이제 거래가 되는구나!’
‘차를 세워주면 문을 닫아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차는 멈추질 않았고 기사는 마치, 누구의 고집이 더 센지 견주어 보자는 것 같았다.
택시는 공항을 거의 다 빠져 나올 무렵이고 나는 시간이 없었다. 지금 내가 약하게 차 세워 줄 것을 사정이나 한다면 그 다음 일(?)은 상상이 갔다.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는 묘해서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는 심리를 가졌다는 것을 책에서 읽은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없는 여유를 부리기로 작정을 했다. 말이 여유지, 솔직히 그 상황에 무슨 여유가 있었을까?
든든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 때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를 점점 위기로 빠뜨릴 뿐 소용없는 일이었다.
지금의 실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현지인 친구가 제일 적격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 할로 Bu FIDO. 나, 방금 도착해서 이런(자세히 설명) 택시(?)타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
하면서 나는 용기를 더 내어 조금 열었던 차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 때 , 택시기사는 마음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후, 드디어 달려오는 뒤차에 의해 차가 부서질까, 겁이 났던지. 아님 무엇 때문인지 택시기사는 속도를 줄였다.
나는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문을 열어 두고 버텼다.
택시기사는 공항 주변 한 바퀴를 빙 돌아 처음의 그곳(내가 탔던)에 나를 내려다 주면서 일만 루피아를 내라는 것이었다.
'휴우~' 영화 같은 현실이었다.
나는 수업료 일만 루피아를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겨서 미안합니다. 언어가 당신보다 유창하지 못해서 그렇지 머리는 당신보다 더 좋을 걸, 내가 좀 덜렁대서 그렇지.’
라고 소리 없이 소리 지르고 있었다.
아찔한 현장을 거쳐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왔을 때, 나는 심각한 체험으로 인해 한 단계 더 성숙해 지고 있었다.
또 이렇게 낯선 세상을 하나씩 접수하고 이해하며 나 자신을 키웠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밥그릇에는 돌보다 밥이 많다고 생각해야 하듯이, 세상에는 좋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했다.
막상 지난 이야길 떠 올리며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사실, 그 날은 이국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서럽고, 늘 당당했던 내 감정은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자. 이제 찻잔도 비워졌고 기다리던 손님도 도착했다.
가루다항공 타고 자카르타 공항을 떠나 수라바야(제2도시)로 가야겠다. 갈 때도 올 때처럼 창 쪽에 앉아야지.
김성월 : 여행작가/ 수필가, 사진가/
2006년 재외동포재단 문화콘텐츠 우수KNN상 수상
출간저서 :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지!>, <인도네시아 그 섬에서 멈추다>
사진전 : <붓과 렌즈로 담은 인도네시아> – KCC(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김성월 사진전> - indonesia day, JI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현, 한국문인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수필가협회 회원